42회: 황혼의 사랑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의 두 사람은 마음이 무겁다. 방금 병실에서 뵌 86세의 할아버지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못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날도 아침에 병원에 갔다 오며 같이 먹자고 감을 사 들고 들어오셨는데..”
할머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마음이 답답하다. 할아버지는 점심을 잡수신 후 화장실에 가셨다가 넘어지며 하체에 크게 골절상을 입었고 독일어가 짧은 할머니 대신 직접 앰블랜스 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셨다. 의사와 상의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수술에 들어가는데 그만 그 후로는 다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미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병을 갖고 계셨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때 보여요? 그냥 주무시는 것으로 보이죠? 다시 일어나실 것 같아요?”
내게 묻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위로가 될지 알 수가 없다.
할머니는 예순다섯 살에 일흔이 넘은 할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다. 할머니는 원래 서울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장성한 아이들이 출가하여 슬하를 떠나자 독일에 사는 동생들이 혼자 지내는 언니가 외로워 보였는지 불렀단다.
일찍이 간호사로 독일로 떠난 후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동생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동기간에 같이 모여 살고 싶어서 과감히 독일로 건너오셨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많아지며 고용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지자 비자 연장이 안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 뭐 해 먹고 사나 고민하던 차에 마침 선 자리가 들어와서 지금의 할아버지를 만나셨다. 허우대가 멀쩡하고 키가 커다란 양반이 자기를 보더니, 맘에 들었는지 결혼하자고 하셨단다. 체구가 아담하고 곱게 꾸미시는 할머니라서 과연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여 아는 것도 많고, 잘생기고 다정하기까지 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또 고마웠다. 동생들이 사는 독일에 계속 살 수 있게 된 것이 다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되었었다. 상처한 후 몇 년 동안 혼자 처량하게 살던 홀아비를 구제해 주었다고 떠벌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그저 감사하고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의 처지가 마음이 아팠다.
“우리 할아버지는 3대 독자인데 자식을 못 얻어서 그게 참 안됐어. 나는 한국에 아들들이 있지만요.”
평소에 조용하신 할머니인데 나와 병원을 가는 길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꺼내 놓으셨다. 할아버지의 이전 결혼에 대해서도, 몇 번 본 적이 없는 시댁 식구에 관한 이야기도 덤덤히 풀어놓으셨다. 시기나 질투, 미움, 원망과 같은 소모적인 감정이 다 빠진 채 현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인생을 충분히 산 후 새로 만난 인연과 사이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일까?
“함부르크에 사는 김 씨 아저씨가 중신을 서서 할아버지는 만나 결혼한 것이 벌써 15년이나 지났네요. 내세울 살림은 없어도 그동안 참 재미지게 살았네요. 앞으로 5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고령 환자의 상태가 나쁘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였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희망의 끈을 버리실 수가 없다. 당뇨로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할아버지의 식단에 맞춰 여든의 나이로 삼시 세끼 밥을 차리고 적은 연금으로 빤한 살림을 꾸리기가 녹록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하고 소소하게 일상을 나누었던 것을 얘기하는 얼굴에 행복이 스며있다. 조골조골한 주름 속에서 새색시 같은 수줍음이 잡힌다.
젊었을 때 할머니는 치매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3년간 직접 병구완을 하셨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젖은 면봉으로 할아버지의 마른 입을 적시는 손길이 능숙하다. 환자의 몸을 이리저리 구석구석 살피고 차갑게 식은 발을 주무르고, 털양말을 가져다 신기고, 손을 잡고 얘기를 걸고 정성을 다해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병실을 떠날 때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지 누워계신 할아버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인사를 반복한다.
“여보, 내일 또 올게요. 내일은 벌떡 일어나서 나와 얘기해요. 얼른 나아서 의식을 차려줘요. 내일 봐요. 잘 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다시는 의식을 찾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파독 광부로 독일에서 일생을 보낸 할아버지의 동료와 후배들이 빈소를 찾아와 절을 하고 사오십 년이 넘는 오랜 인연을 얘기하자 할머니의 결혼생활은 더욱더 짧게 느껴졌다.
원래 행복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짧은 것일까? 그렇기에 더 아쉽고 귀한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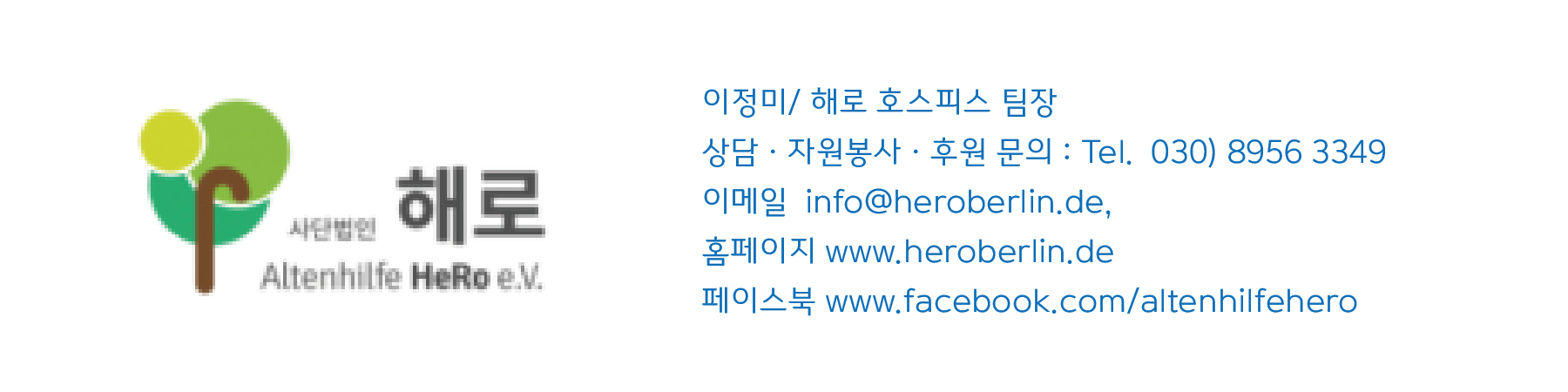
1246호 16면, 2021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