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문화사업단은 독일어권의 전후 문학으로, 1, 2차 세계 대전을 치른 독일어권의 문학계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4명의 작가를 선택하여 살펴본다.
작가에 따라, 인간 본연의 모습에 천착하거나, 시대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되고, 또는 과거 불행한 시대에 대한 고발 등 다양한 형태로 작품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모든 근원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뒤 ‘과연 인간의 이성은 진보하며 신뢰할 수 잇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작가 막스 프리쉬, 뒤렌마트, 하인리히 뵐, 귄터 그라스를 탄생 연도순으로 연재한다.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②
전후 독일 문단을 이끈 소설가
지난호에서는 하인리히 뵐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뵐의 대표작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하인리히 뵐 작가의 대표작
◈ 『열차는 정확했다』 전쟁에 말려든 인간의 무기력과 공포
『열차는 정확했다(Der Zug war pünktlich)』는 하인리히 뵐의 처녀작이다. 뵐은 20대 초반에 겪은 전쟁을 그대로 글로 옮겼다. 전쟁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 아니라 그 커다란 사건에 말려든 인간의 무기력과 공포, 불안을 이야기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어처구니없이 사라져가야 하는 한 인간의 억울한 운명이다. 전장으로 돌아가는 휴가병 열차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주인공 안드레아스는 전쟁, 그 안의 인간을 보여준다.
뵐의 전쟁문학의 목표는 인간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전쟁 때문에 어처구니없이 사라져야 하는 인간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이지 승리가 아니다. 『열차는 정확했다』의 등장인물인 동갑내기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적대감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며, 적국이니 아국이니 하는 용어도 소용이 없다. 그들은 동시대의 희생자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전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후 참상과 가난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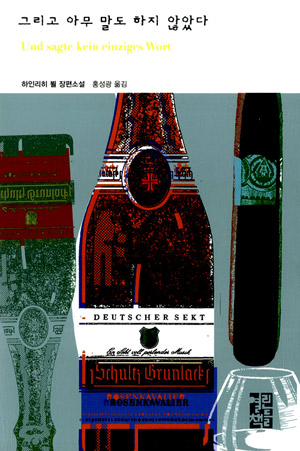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Und sagte kein einziges Wort』는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전후의 참상과 고통에 침묵해야만 했던 이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1948년의 화폐 개혁 후에 서독의 대도시인 쾰른에서 벌어진 일을 부부 각자의 관점에서 그린 이 소설은 1952년 9월 30일 토요일 오전에 시작되어 10월 2일 정오경에 끝난다.
가장인 프레드 보그너는 좁은 단칸방에서 아내 캐테, 세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다른 데서 산다. 그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포격으로 파괴된 도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 그의 아내 캐테 보그너도 절망적인 일상생활과 위선적인 가톨릭 신자인 집주인 프랑케 부인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수모를 견디며 초라한 방에서 억지로 살아간다. 또 다시 아이를 임신한 그녀는 싸구려 호텔에서 남편과 함께 밤을 보내며 자신이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만 그와 헤어지기로 마음 먹는다. 그런데 부부가 단칸방에 사는 까닭은 그들이 게으르거나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주인 프랑케 부인의 횡포 때문이다.
지역의 성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프랑케 부인은 주택을 배정하는 문제에서 부부를 도와주기는 커녕 방해를 한다. 사회에서 낙오한 보그너는 진실이 결여된 불공평한 사회에서 권태와 좌절을 느끼며 그 사회에 동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탈락자이자 국외자가 된다. 아이를 많이 갖지 말라는 사회적 권유를 묵살하고 네 번째 아이를 가진 캐테 역시 사회 부적응자라 할 수 있다. 뵐은 이 작품을 통해 가난은 사회적 책임이란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 『아홉시 반의 당구』 과거극복의 문학적 형상화
『아홉시 반의 당구(Billard um halbzehn)』 종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독일에서는 과거를 잊고자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에 이룩한 ‘경제기적’이 가져온 물질적 풍요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독일문학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50년대에 출간된 문학작품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극복되기보다 오히려 ‘망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과거의 나치즘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지크프리트 렌츠(Siegfried Lenz), 하인리히 뵐 등의 문학작품에 반영되고 있다, 이들 중 대표적 작품이 1959년 출판된 하인리히 뵐의 소설 『아홉 시 반의 당구』라고 할 수 있다.
뵐은 독일의 과거사가 아직 극복되지 않았음을 자신의 문학작품을 통해 계속 인식시킨 작가로서 『아홉 시 반의 당구』에서는 서독정부출범이후 약 10년간 금기시되었던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아홉 시 반의 당구』는 어느 건축가 집안의 삼대에 걸친 운명사이다. 주인공 하인리히 패멜의 80회 생일인 1958년 9월 6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이야기로, 빌헬름 제국부터 아데나워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회상을 통해 서술된다. 비연속적이고 서술시점의 변화가 심한, 복잡한 서술기법이 쓰인 이 작품은 성 안톤 수도원, 물소와 양 등의 상징, 연상과 내적 독백을 통하여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뵐은 이 작품으로 독일 비평가 협회 문학상을 비롯해 여러 문학상을 휩쓸었고 47년 그룹에서도 작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가톨릭 성직자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로 가톨릭 교계로부터는 격렬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 『여인과 군상』 인간적인 것의 가치를 새로이 부각
『여인과 군상(Gruppenbild mit Dame)』 하인리히 뵐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긴 작품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역행하는 주인공 레니의 삶을 주변 인물들의 입을 빌려 구성한다. 사회적 약자들만이 등장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뵐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간적인 것의 가치를 새로이 부각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 환경 파괴를 서슴지 않는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뵐은 이윤만을 추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팔꿈치로 밀어내면서 투쟁하는 거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 균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상업성과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적이기 때문에 허위적인 연대감과 불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일련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행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의 미학’은 『여인과 군상』에서도 이어진다.
◈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언론의 폐해를 다룬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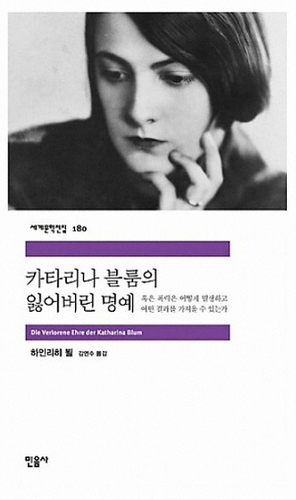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는 발표한 지 6주 만에 15만 부가 팔리고 뉴저먼시네마의 기수 폴커 슐렌도르프에 의해 영화화되어 크게 흥행했던 소설로, 현재까지도 언론의 폐해를 다룰 때 언제나 인용되는 고전이다.
1974년 2월 24일 일요일, 한 일간지 기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살인범은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27세의 평범한 여인. 그녀는 제 발로 경찰을 찾아와 자신이 그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자백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가정관리사로 일하면서도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늘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주위의 호감을 사던 총명한 여인 카타리나가, 도대체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이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화자는, 2월 20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닷새간의 그녀의 행적을 재구성하여 이를 보고한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서 하인리히 뵐은 대중의 저속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어떻게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해 가는가를 처절하게 보여 주고 있다.
1184호 23면, 2020년 8월 28일
